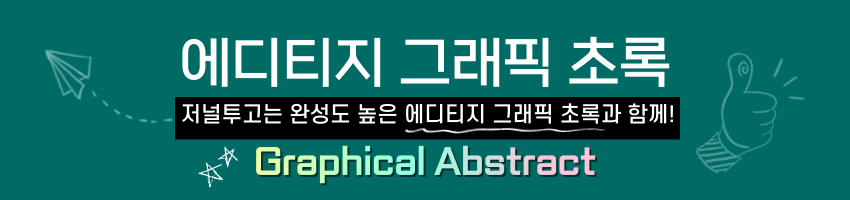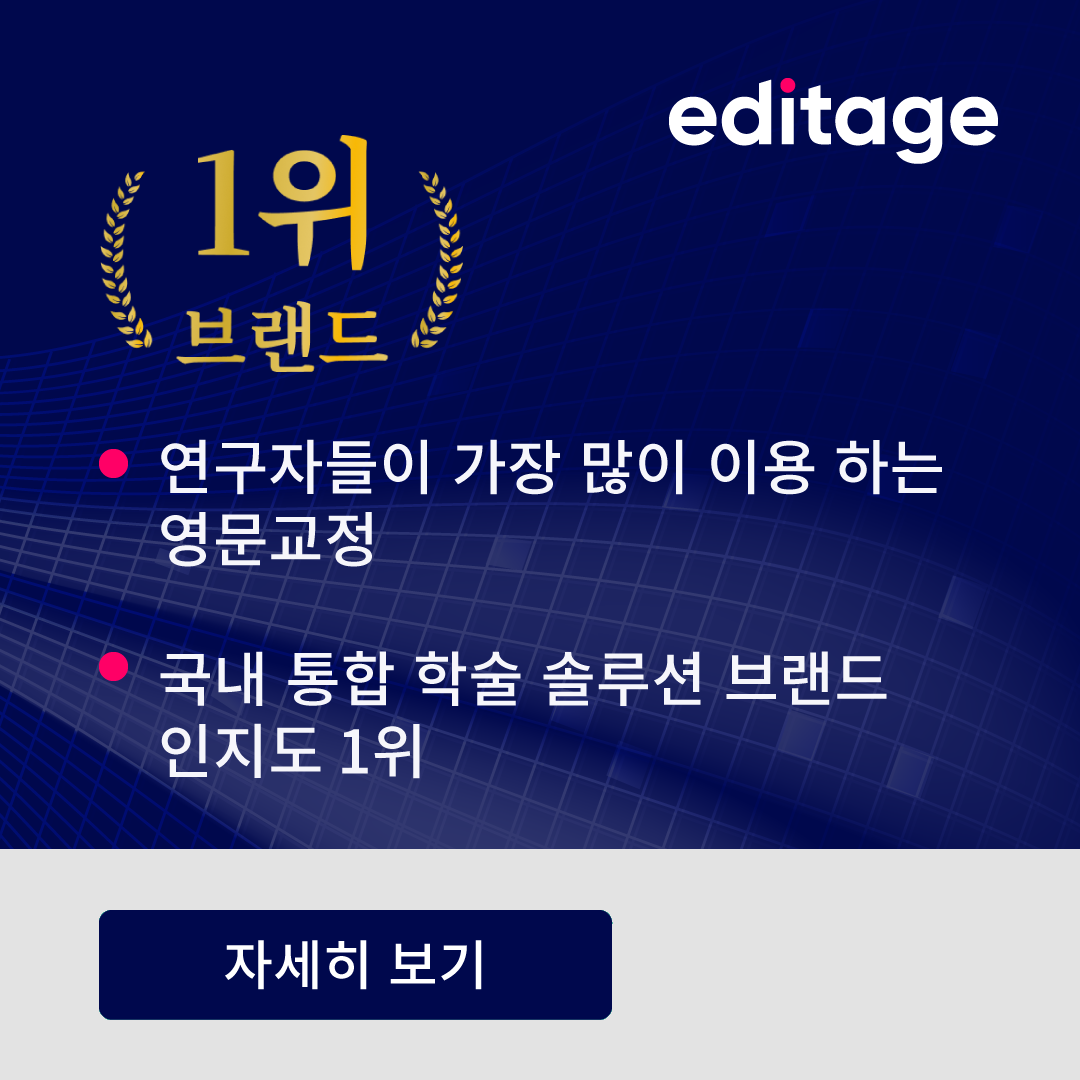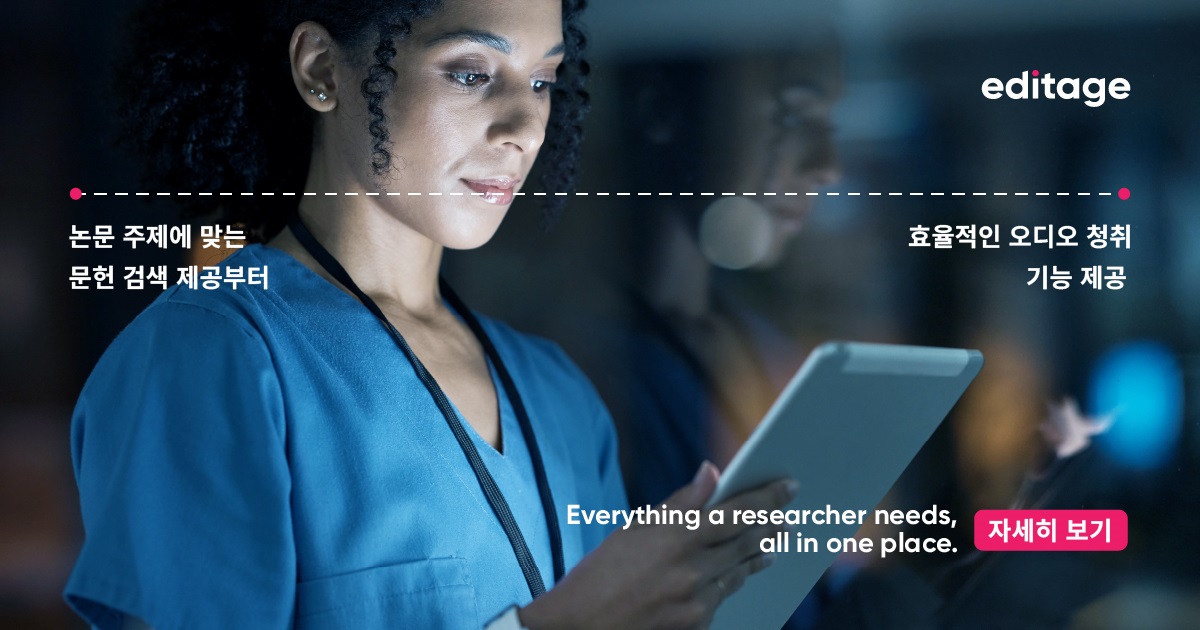올해도 과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의 인물들이 노벨상을 통해 조명되었습니다. 2025년 생리의학상은 면역체계에서 자기 조직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조절 T세포(Regulatory T-cell)를 발견한 메리 브런코, 프레드 람스델, 사카구치 시몬에게 수여되었고, 물리학상은 전기 회로에서 거대 양자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를 실증한 업적으로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에게 돌아갔죠. 화학상은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라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한 공로로 기타가와 스스무, 리처드 롭슨, 오마르 M. 야기에게 수여되었죠.
노벨상은 1901년부터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의 유언에 따라 인류에 가장 크게 이바지를 한 업적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연구자, 과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상을 꿈꾸는 영광스러운 성취죠.
그런데, 혹시 ‘이그노벨 상(Ig Nobel Prize)’도 알고 계신가요? 노벨 앞에 붙은 이그(Ig)는 ‘ignoble’의 줄임말로, ‘하찮은, 우스꽝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노벨 상’은 ‘노벨상’을 살짝 비튼 말장난으로,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죠.
이그노벨 상은 쓸데없어 보여도 의미 있는 발견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과 상상력을 환기시키는 것이 목적인 상으로, 엉뚱하지만 과학적 완성도를 갖춘 연구를 선정합니다. 2017년에는 한국인 한지원 씨가 걸을 때 커피를 잘 쏟는 이유를 규명하며 유체역학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죠.
하지만 이그노벨 상이 마냥 웃자고 만든 상은 아닙니다. 유머러스한 과학으로 우선 웃음을 안긴 뒤, 이를 진지하게 고찰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두 상을 모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드레 가임(Andre Geim)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학사에서 최초로 두 상을 모두 받은 안드레 가임, 그는 누구일까요?
개구리를 띄운 물리학자
20세기 말, 네덜란드 네이미헌 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 가임 교수가 고가의 강력한 16 테슬라(T)의 전자석에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시험 삼아서 말이죠!
그 결과,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부상했습니다. 가임 교수는 이것이 물 분자의 반자성 때문이라고 보고, 충분한 강도의 자기장이 있다면 모든 반자성(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반발하는 성질) 물질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공중에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가임 교수는 딸기, 토마토, 심지어 개구리까지 물을 포함한 물체들을 띄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으로 2000년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기부상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창의적 시도였습니다.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을 추출하다
10년 후, 안드레 가임은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연단에 올랐습니다. “2차원적 소재 그래핀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1로 그의 제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와 함께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 위해서죠.
그래핀이 여러 층 겹친 구조가 바로 연필심으로 잘 알려진 흑연(Graphite)인데요. 그래핀은 얇고 투명하며,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 전도성도 뛰어납니다. 놀라운 소재죠. 그러나 그래핀은 실제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70년부터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구현은 결코 쉽지 않았죠. 2
그러던 어느 날, 가임 교수의 연구팀에 속한 노보셀로프 연구원이 시료 정리를 위해 흑연 표면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스카치테이프에 흑연이 얇게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이프 표면에는 몇 나노미터의 흑연 층이 남아 있었죠!
이를 기반으로 가임 교수의 연구팀은 연구를 진행했고, 결국 단일 원자층 그래핀을 분리해 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래핀 연구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죠.
딴짓의 미학
가임 교수는 연구팀과 주기적으로 ‘금요일 실험 나이트(Friday Night Experiment)’를 갖곤 했습니다. 주요 연구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연구자들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무언가를 실험해 보는 시간이었죠.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도 이 ‘금요일 실험 나이트’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과학은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호기심과 창의성을 통해 발전하기도 합니다. 작은 장난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강력한 자기장 위로 떨어뜨린 물에서 개구리를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안드레 가임처럼 말이죠.
안드레 가임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유머 감각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3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려면 각 잡고 책상 앞에 앉아 연구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은 본짓(traction)보다 딴짓(distraction)을 할 때 더 잘 떠오르곤 한다는 걸, 여러분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나요? 정말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멍을 때리거나 코미디 영화를 한 편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뇌에 여유 공간을 줘야 창의적인 생각도 솟아날 테니까요.
참고 자료
1. 노벨상을 말하다, https://www.sciencecenter.go.kr/scipia/nobel/about/physicsWinfor11
2. 동아사이언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2081
더 읽어 보기
노벨상 수상은 어떤 기분일까요? 노벨상 수상자 팀 헌트(Tim Hunt) 박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