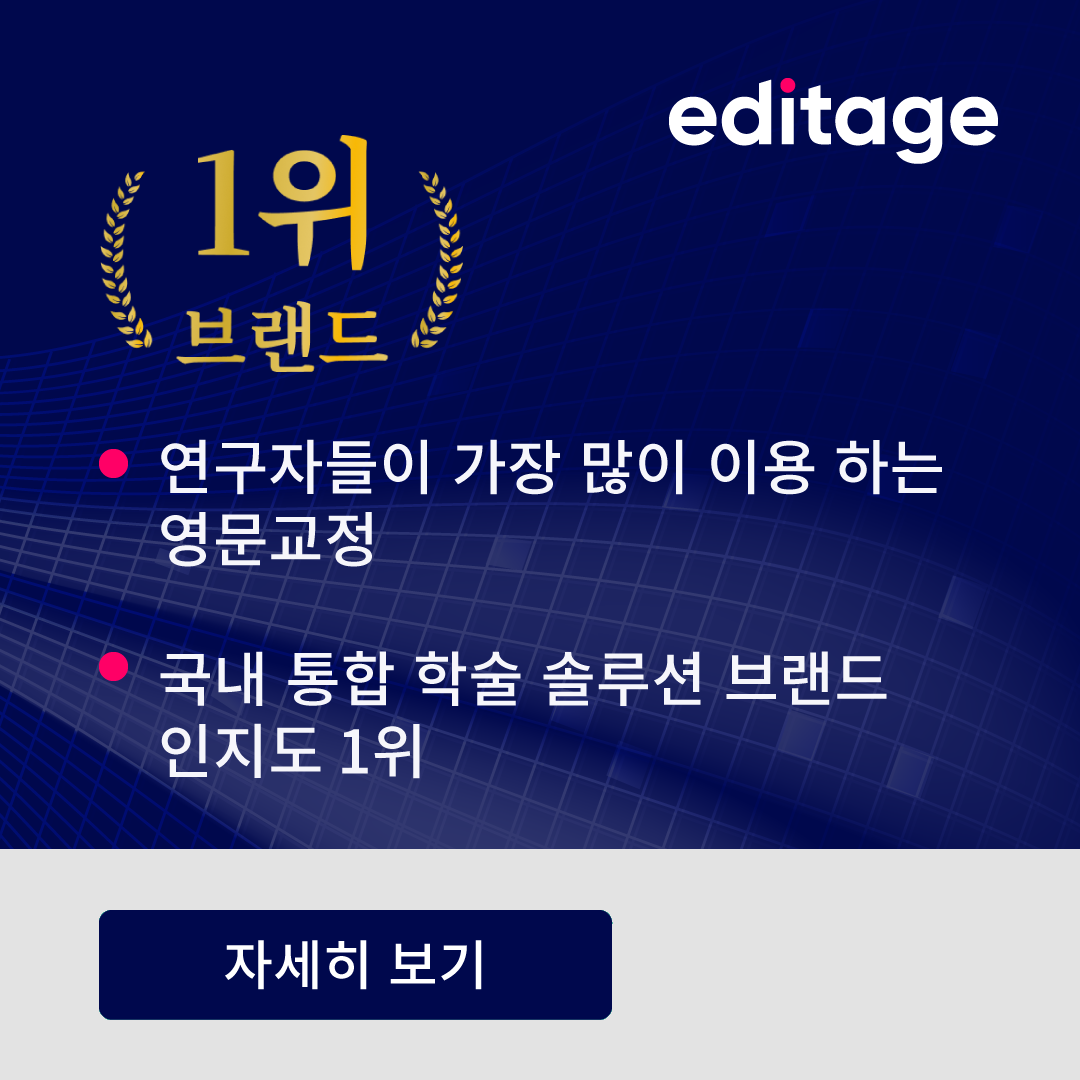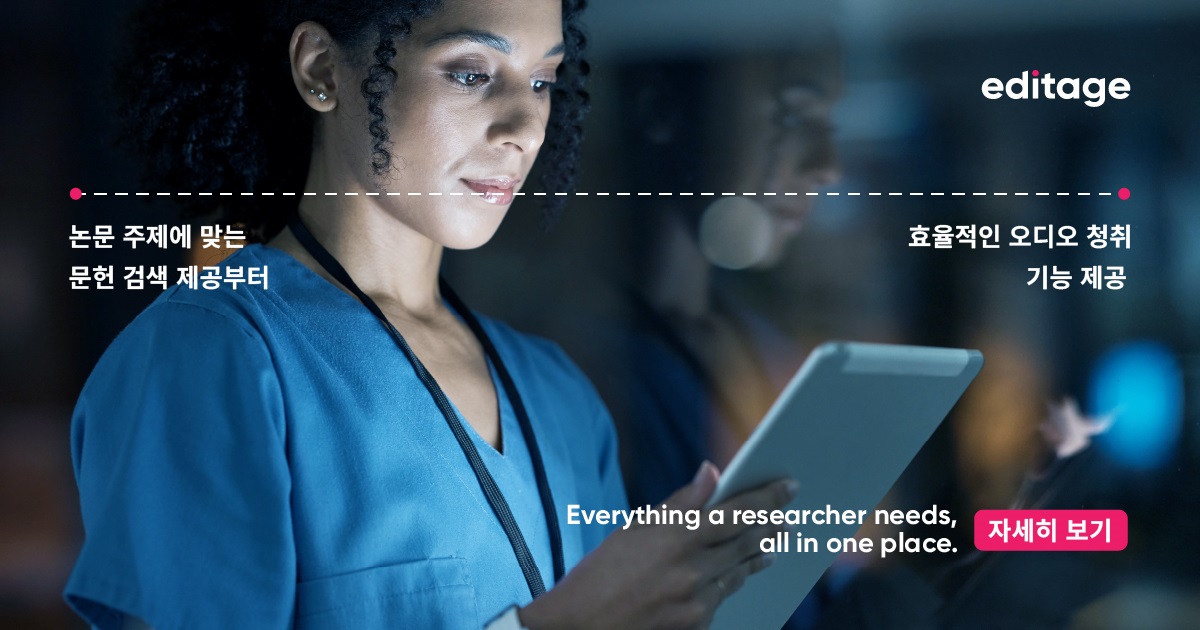아슬리 텔리 박사(Dr. Asli Telli)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 대학교(Witwatersrand University) WISER에서 원격 펠로우십을 통해 부교수 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럽대학원(European Graduate School)과 애팔래치안 주립대(Appalachian State University)에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각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터키, 스위스, 몰타, 프랑스, 독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국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자문해 왔습니다. 평화를 위한 학회(Academics for Peace - Germany), 유럽 디지털 권리(EDRi), 디지털 자유 기금(Digital Freedom Fund)의 지식 및 디지털 권리의 탈식민지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공식 및 비공식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관찰해 온 텔리 박사는 멘토링을 통해 연구자들이 까다로운 학계의 여정을 자신 있게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멘토링에 관한 텔리 박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학계에서 멘토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많은 자료에서 멘토링은 학술적 삶의 기초적인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멘토링의 기원이 학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멘토링은 자격을 갖춘 학생과 초기 경력 연구자(ECR)의 학계 진입과 경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저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멘토링은 학계 밖에도 인생이 있다는 사실, 즉 인생에는 도전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인간다움을 느끼고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학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학계 밖’의 삶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것을 ‘워라밸(work-life balance)’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라밸이라는 표현은 제도적 부조리에 맞서는 게 아니라 순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이 과도하다면 이에 관해 논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멘토라면 상황에 개입해 멘티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무 시간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라면 단지 연구자, 학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멘티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관계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때때로 이러한 현실을 다시금 상기해 주어야 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커리어에 몰두하곤 하죠. 개인적으로 ‘인생 코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학계에서 멘토가 바로 인생 코치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학계에서 멘토는 멘티의 커리어 목표와 성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멘티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자는 특히 오늘날 학계에서 살아남는 데 무척 중요한 요소죠.
박사님도 연구 여정을 시작할 때 멘토가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멘토가 학자로서 박사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제 필요를 모두 해소해 줄 수 있는 멘토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비공식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멘토는 몇 명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멘토링 관계’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제가 필요로 할 때 늘 곁에 있어 주었죠.
그중 한 분이 제가 두 번째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무척 관대한 분이었죠. 제가 계속해서 시간도 없고 힘도 없다고 불평해도 인내심을 갖고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가 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려 노력하셨어요. 이때, 연구 논문을 쓰던 때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교수님의 긍정적인 지도는 제가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던 때에는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채점 시간을 줄일 수 있었죠. 또한, 타인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저를 안내한 최고의 멘토셨죠.
최근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멘토’라는 단어가 연차가 많이 나는 선배나 고도로 숙련된 사람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하더군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단계에 이르면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멘토에게서 필요로 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정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관련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공식적인 멘토링은 선배의 전문성을 배울 기회인 동시에 생생한 삶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료 연구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시간 여유가 있고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 멘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선배나 풍부한 경험의 멘토가 있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유익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필요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선배들도 젊은 관점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죠.
저는 경력 초기 단계에서도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여지는 어디에나 있죠. ECR이나 동료를 돕고 싶고 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소프트 스킬과 전문성을 발휘해 보세요. 연구자들을 위한 여러 비공식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ECR이라도 연구자를 지망하는 학생이나 동료에게 대면이든 가상이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멘토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멘토링 관계를 시작할 때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둘 사이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계획을 원활히 수립하면 좋죠. 계획이 늘 100%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를 보완하는 것이 멘토의 역할입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멘토링 기간은 유연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가짐으로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과정은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와 멘티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 관계가 보통 6~12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 두 사람은 친구가 되겠죠. 제 첫 멘티는 약 15년 전 제가 가르치던 박사 과정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멘티가 멘토링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 잘 맞는 게 중요합니다. 멘티의 니즈가 구체적이며 단기간 내에 상담과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반에 멘토와 멘티가 프로세스와 각 단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하고 성실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보통 멘토는 많은 일정으로 아주 바쁘다는 사실을 멘티가 인지하고 정기적인 통화나 만남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양쪽이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해나 감정적인 벽이 있다면 서면으로든 통화로든 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멘티의 목표가 현실적이며 합의한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고 건강한 관계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6개월에 걸친 멘토링이 끝날 무렵, 언젠가 자신도 멘토로서 동료들을 도울 거라고 결심한 제 멘티 중 한 명이 떠오르네요. 그때 그 친구가 저와의 멘토링에서 많은 걸 배웠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었죠.